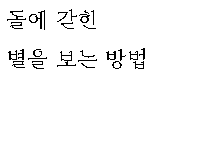" 돌을 보며 그 안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을 이루는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
문서진, <내가 그린 가장 큰 원>, 2016, 퍼포먼스/영상, 20분
<내가 그린 가장 큰 원>은 문서진이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팔을 최대한 뻗어 커다란 원을 그리는 퍼포먼스(영상) 작품이다. 원을 그리는 동안은 전체를 볼 수 없다. 단지 그리는 그 순간의 동작에 집중하게 될 뿐이다. 그는 손끝, 발끝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가장 크고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 노력한다. 원을 그리는 과정은 아무 의미 없는 돌과 닮아 있지만, 있는 힘껏 몸을 뻗어내는 구슬땀 어린 수행을 통해 내면의 별을 찾게 된다.
― 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컴퍼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작가님을 캠퍼스에 비유하신 이유와 그것이 되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컴퍼스처럼 몸 전체로 원을 그리는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을 직접 실행한 작업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떠올렸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그 이전에 조각을 했을 때의 경험들과 연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각은 재료를 만지고 그 무게를 근육의 힘으로 감당하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몸으로 부대끼며 조각을 다루다 보면, 내가 다루고 있는 재료의 무게나 질감과 같은 물리적 대상만큼이나 나 자신의 몸을 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과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 작업을 상상하게 되었고, 내가 다뤄왔던 조각적인 재료들의 자리에 나의 몸을 놓고 보는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 <내가 그린 가장 큰 원>에서는 오감 중 촉각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른 감각보다 촉각에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만졌을 때의 느낌, 어떤 것에 닿는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닿고 만진다라는 느낌으로부터 감각과 생각이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내려 앉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몸을 써서 뭔가를 할 때 생각과 마음이 몸과 함께 작동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몸을 쓴다는 것이 어딘가에 닿아서 감각하는 일과 연관되면서 자연스럽게 촉각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어요. 물리적 세계와 몸을 부대끼고 그 몸부대낌을 통해 감각하고 사고하는 일이 조각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촉각이 조각의 주요한 언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것의 표면에 접촉해서 닿는다는 것이 신체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미적 판단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 물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대한 과학의 대답들은 항상 흥미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과학의 이야기를 얕은 이해로나마 주워들으면서, 어떤 것에 ‘닿는다’는 촉각의 과정은 모든 감각의 근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였어요 .시각은 망막에 닿은 빛의 광자를 감각하여 그 상을 뇌에서 재구성하는 것이고, 청각은 고막을 두
드리는 소리의 파장을 감각하는 것, 미각은 혀에 닿는 음식 분자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고, 후각은 후각세포에 닿는 냄새 분자를 감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감각은 어떤 것에 닿는다는 일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언가에 닿는다는 촉각적인 과정은 모든 감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드리는 소리의 파장을 감각하는 것, 미각은 혀에 닿는 음식 분자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고, 후각은 후각세포에 닿는 냄새 분자를 감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감각은 어떤 것에 닿는다는 일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언가에 닿는다는 촉각적인 과정은 모든 감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 '내 작업에서 다 떼도 남는 것은 태도가 될 것'이라는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 작업에서 집중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가장 큰 원>을 작업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태도는 무엇인가요?
제 작업이 어떤 명확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프로젝트 마다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작업의 내용도 구상단계에서는 아주 희미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작업 과정 중에 느끼는 점이나 발견하게 되는 것들로 내용이 만들어지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다루느냐 보다 어떻게 다루느냐가 작업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더 태도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었고요. ‘어떻게’ 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중 집중력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라 하면... 글쎄요.... 사실 작업을 만드는 것에 있어, 작업 진행의 매 단계에 내 나름의 적절한 대응 혹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태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모든 순간에 통용되는 하나의 대응이나 마음가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순간에 집중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 집중력을 놓쳐서 어떤 단계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돌아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가야 하는 길은 결국엔 밟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그냥 한다’ 이런 생각 정도인 것 같은데요.
― 주로 '몸을 쓰는 일'과 조각을 작업 방식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다른 것이 아닌 몸을 쓰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일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몸을 써서 뭔가를 해야 생각도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라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잡생각이 많아서 생각만으로는 뭔가 공회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무거워질 때가 많은데, 몸을 써야 그런 무게가 좀 덜어지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몸을 쓰는 게 저에게는 일종의 생존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몸을 써야 비로소 생각과 마음이 한 곳에 놓이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누구나에게 몸이 가는 곳에 생각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닌데 종종 별개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자신부터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생각을 흐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몸을 쓰는 거라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완성을 염두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 작업 과정 중에 느끼는 몸의 감각과 몸을 쓰면서 생각이 흐르는 상태가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몸으로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 관계를 맺는 일련의 작용이 곧 조각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제가 하는 작업이 퍼포먼스이든 혹여는 다른 방식이나 매체를 선택하든, 결국의 조각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그게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퍼포먼스 작업에서 하는 움직임들은 짜여진 안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순한 움직임인 경우가 많아요. 왠지 ‘퍼포머’라고 하면 안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움직임을 주된 매체로 하시는 무용가나 안무가를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미술을 배우면서 처음 언어로 접한 것이 조각이라는 교육적 배경도 작용하겠지요.
― 전시명처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돌에 갇힌 별'은 무엇인가요?
돌에 갇힌 별이라는 전시명을 들었을 때는, 별똥별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떨어질 때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담긴 낭만적인 별이었다가 그 찰라의 순간이 지나고 지면에 떨어지고 나서는 다만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돌이 되는 장면을 되는 상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별똥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나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들처럼 밤하늘의 별은 낭만과 믿음, 소망이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땅에 떨어진 별은 다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수많은 돌덩이 중 하나가 된다는 걸 생각해보게 됩니다. 돌을 보며 그 안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을 이루는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